말에 언품(言品)이 있듯 글에는 문격(文格)이 존재
마음, 처음 등 21개 키워드로 생각거리도 던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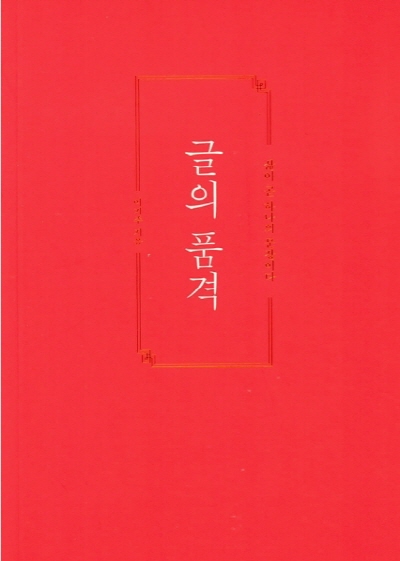
요즘 인터넷은 세상의 온갖 더러움에 오염된 문장, 오문(汚文)으로 악취가 진동한다. 미국 경제학자이자 문명비평가 제러미 리프킨은 공감의 시대에서 현존 인류를 공감하는 인간이라고 규정했다. 그가 만약 우리나라 주요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달리는 댓글을 한두 시간만 정독했다면 “현존 인류는 공감하는 인간인 동시에 키보드 무기로 공격도 하는 인간이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싶다.
주역에 이르기를 서부진언(書不盡言)이라 했다. “글로는 말하고 싶은 것을 다 적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문장이 닿을 수 없는 세계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얘기다. 달리 말하면 글이 지닌 한계와 무게를 알고 글을 적어야 한다는 것. 오늘날 분노를 머금고 우리 손끝에서 태어나 인터넷 공간을 정처 없이 표류하는 문장들이 악취를 풍기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 망설임 없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글을 토해내기 때문인지 모른다.
저자는 이 책에서 말에 언품(言品)이 있듯 글에는 문격(文格)이 있다고 주장한다. 세상 모든 것에는 나름의 격이 있다. 격은 혼자서 인위적으로 쌓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삶의 흐름과 관계 속에서 자연스레 다듬어지는 것이다.
문장도 매한가지다. 품격 있는 문장은 제 깊이와 크기를 함부로 뽐내지 않는다. 그저 흐르는 세월에 실려 글을 읽는 사람의 삶 속으로 퍼져 나가거나 돌고 돌아 글을 쓴 사람의 삶으로 다시 배어들면서 스스로 깊어지고 또 넓어진다.
깊이 있는 문장은 그윽한 문향(文香)을 풍긴다. 그 향기는 쉬이 흩어지지 않는다. 책을 덮는 순간 눈앞의 활자는 사라지지만, 은은한 문장의 향기는 독자의 머리와 가슴으로 스며들어 그곳에서 나름의 생을 이어간다. 지친 어깨를 토닥이고 상처를 어루만지는 꽃으로 피어난다.
타인은 원뿔과 닮았다.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이를 무시한 채 한쪽에서 삼각형이라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선 원이라고 박박 우기면 둘의 의견은 영원히 만나지 않는 평행선처럼 교점을 찾지 못한다.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를 향해 폭언과 욕설을 내던지면 일시적으로 분노를 배출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문장을 쏟아낸 마음의 언저리는 곪을 수밖에 없다. 오염 처리 없이 폐수를 방류하는 공장 주변의 땅이 시커멓게 썩어버리듯이 말이다.
말수가 적음을 뜻하는 한자‘눌訥’은 말하는 사람의 안內에서 말言이 머뭇거리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는 신중하게 말하는 자세를 뜻하기도 한다. 글쓰기에서도 때론 머뭇거림이 필요하다. 쓰고 싶은 욕망을 억눌러 문장에 제동을 걸 줄도 알아야 한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달필(達筆)의 능력이 아니라 눌필(訥筆)의 품격이 아닐까?
이 책은 마음, 처음, 도장, 관찰, 절문, 오문, 여백 등 21개의 키워드를 통해 글과 인생과 품격에 대한 생각들을 풀어냈다. 고전과 현대를 오가며 볼거리와 생각할 거리를 동시에 전한다.
